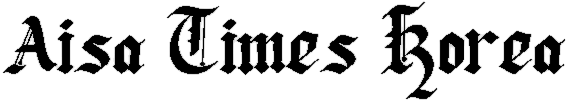SK그룹과 NVIDIA, CES 2025에서 AI 반도체 동맹 강화
세계 최대 규모의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 ‘CES 2025’ 개막을 하루 앞둔 6일 오후,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만달레이 베이 컨벤션 센터의 미켈롭 울트라 아레나에서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이 행사는 특히 SK Group과 그 자회사가 관련된 기술 산업에서 중요한 발전의 무대를 마련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CES 2025에서 엔비디아와 AI 반도체 동맹을 공고히 했다. 최 회장은 9개월 만에 황 대표를 만나 고대역폭메모리(HBM)의 급속한 발전을 높이 평가하고, AI 패권 싸움의 종착지로 여겨지는 ‘물리 AI’에 대한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최 대표는 엔비디아에 SKC 유리 기판 공급을 시사하며 협력 범위를 확대할 것임을 시사했다.
최 회장은 8일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2025 SK 전시장에서 국내 기자들과 가진 기자회견에서 “오늘 황 대표를 만났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이후 첫 대면 회담이다. 최 대표는 “기존에는 SK하이닉스의 개발 속도가 엔비디아의 수요 증가에 비해 약간 뒤처져 있었기 때문에 상대방(엔비디아)이 HBM 개발 속도를 높여달라고 요청했다. 최근 SK하이닉스의 개발 속도는 이러한 수요를 뛰어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면 돌격 전략은 양측이 개발 속도를 가속화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HBM과 관련하여 논의된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최 대표는 SK하이닉스의 HBM 개발 경쟁력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고, 황 대표는 이러한 기술력을 인정했다.
최 회장과 젠슨 황 대표는 이번 CES의 주요 주제인 ‘물리 AI’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최 대표는 “이번 CES는 로봇과 AI가 우리 일상에 접목된 이른바 ‘피지컬 AI(Physical AI)’가 보편화되고 보편화됐음을 확인시켜줬다”며 “황 대표와 피지컬 AI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함께 시도해보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것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서 시장의 관심은 SKC의 유리 기판에 쏠렸다. 최 대표는 SK그룹 부스를 둘러보던 중 SKC의 유리 기판 모형을 들어 올리며 “방금 팔았다”고 웃으며 말했다. 이는 그가 고객에게 유리 기판의 공급을 확인했음을 의미합니다. 시장과 업계에서는 최 대표가 황 대표를 만난 뒤 오전 11시쯤 SK그룹 부스를 방문한 점을 감안해 SKC의 유리 기판이 엔비디아에 공급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최 회장은 황 대표를 만난 직후 CES 전시장을 방문했을 가능성이 높다.
유리 기판은 반도체 산업에서 “게임 체인저”로 간주됩니다. 기존 플라스틱 기판보다 표면이 더 매끄럽기 때문에 리소그래피 장비를 사용하여 더 많은 초미세 선폭 회로를 그릴 수 있어 반도체 속도가 40% 증가하고 전력 소비는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또한 중간 실리콘 기판의 필요성을 제거하여 패키지 두께를 절반 이상 줄입니다.
SKC는 유리기판 사업 투자회사인 앱솔릭스(Absolix)를 통해 시장 선점을 노리고 있습니다. 미국 조지아주에 세계 최초 양산공장을 완공했다. 지난해에는 미국 정부로부터 7,500만 달러의 생산 보조금과 1억 달러의 연구개발(R&D) 보조금을 확보하며 기술 혁신을 인정받았다. Absolix는 현재 여러 고객사와 양산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 회장은 AI 패권 확보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최 총리는 “AI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며 “경쟁에서 뒤처지면 반도체든 조선업이든 우리나라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모든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인공지능 패권 싸움에서 기술독립을 이뤄내야 하는 우리나라가 강력한 제조업이라는 국가적 특성을 살려 인공지능 산업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AI 기술의 진화가 가져온 변화의 물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술적 격차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대표는 SK와 삼성전자 부스를 둘러본 뒤 AI 기술에 대해 “우리가 변화를 주도하느냐, 따라가느냐에 따라 부침의 형태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지난해 12월 ‘CEO 세미나’ 폐회사발표에서 “차세대 챗GPT의 등장에 따른 AI 시장 확대는 2027년쯤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 교수는 우리나라가 제조업의 압도적 강점이라는 국가적 특성을 충분히 활용해 글로벌 초일류 AI 기술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 대표는 “전문성 없이 AI 사업을 추구한다면 어떤 기업이나 스타트업도 글로벌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며 제조업 관련 AI, 로봇 관련 AI 등 분야에 대한 전략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AI 기술 주권의 중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어떤 형태로든 애플리케이션프로그래밍인터페이스(API)를 직접 개발해야 한다”며 “AI 인프라를 다른 나라에 의존한다면 독자적으로 미래를 개척하기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대표는 AI 기술 주권 확보를 위한 AI 인프라와 인적 자원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 대표는 “우리나라에 가장 필요한 것은 AI 인프라와 인력”이라며 “교육을 통해 사람들이 AI를 꾸준히 이용할 수 있는 기본 환경을 만들고, AI를 만들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AI를 실험하고 성과를 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