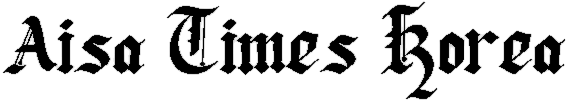‘딥시크(DeepSee) 공포증’이 사방으로 확산: 민간 부문도 접근 차단
중국의 인공지능(AI) 플랫폼인 딥시크(DeeSeek)는 한국에서 공공부문에서 민간기업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규제에 직면해 있다. 한화그룹은 모든 계열사에 대해 DeepSeek 접근을 차단했고, 롯데그룹과 신세계그룹도 접근 제한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금융 부문도 이를 따랐으며, 대부분의 기업은 민감한 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한화그룹은 내부 업무망 및 회사 PC에 대한 DeepSeek 접근을 차단하기로 결정했으며, 기존에는 한화항공우주우주 등 방산계열사와 한화생명 등 금융계열계열에만 제한규제가 적용됐으나 이제는 모든 자회사로 확대됐다. 롯데그룹은 내부 정보 보호를 위해 DeepSeek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조치는 딥시크뿐만 아니라 챗GPT를 포함한 모든 생성형 AI 플랫폼에도 적용된다. 대신 임직원은 롯데이노베이트의 AI 플랫폼인 ‘아이멤버(iMember)’를 사용해야 한다. 신세계그룹도 같은 날 직원들에게 “딥시크 접속을 전면 금지한다”고 통보하며 제한 조치를 재확인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전자 등 주요 기업들도 내부 PC에서 외부의 AI 무단 사용을 차단하고 있다.
매우 민감한 개인 데이터를 처리하는 금융 부문도 DeepSeek을 금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KB금융지주와 KB국민은행은 2월 3일부터 출입을 차단했고, 하나은행과 우리은행도 출입을 제한했다. 토스뱅크(Toss Bank)와 케이뱅크(K Bank)와 같은 인터넷 은행들도 마찬가지로 딥시크(DeepSeek)의 사용을 금지했다.
민간 기업이 조치를 취하기 전에도 대부분의 정부 부처는 이미 DeepSeek에 대한 액세스 제한을 시행했습니다. 지난 2월 6일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주요 부처가 플랫폼 사용 금지 입장을 밝혔다. 경찰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도 DeepSeek에 대한 접근을 제한했습니다. 한편 국가정보원은 모든 정부기관에 업무 관련 기밀 정보 입력 금지 등을 담은 ‘생성형 AI 활용 보안 지침’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개인 데이터가 중국 정부에 전송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구체적인 증거도 있습니다. AP통신은 이날 캐나다 사이버보안업체 페루트 시큐리티(Feroot Security)의 연구를 인용해 중국 최대 통신사인 차이나모바일(China Mobile)의 컴퓨터 인프라로 연결되는 코드가 딥시크(DeepSeek) 챗봇의 웹 로그인 페이지에서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염흥열 순춘향대 정보보안학과 명예교수는 “2021년 제정된 중국 데이터보안법에 따라 중국 정부가 이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만, 이탈리아, 일본, 호주도 DeepSeek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중국 정부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류웨이(劉偉) 베이징 우편통신대학(北京天大學) 인간-기계 상호작용 및 인지공학 연구소 소장은 관영 글로벌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는 기술적 우려보다는 이념적 차별에 의해 주도되고 있음이 분명하다”고 밝혔다.